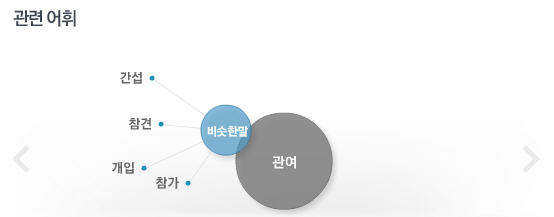‘관여’의 네이밍, ‘인지’의 브랜딩
네이밍과 관련하여 흥미롭게 들은 뒷담화가 하나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OO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던 회사이지요.
신제품 출시에 맞추어 네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답니다. 이에 몇몇 압축안이 마케팅 전략회의 때 제시되었지요. 사내에서 네임을 개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다수결로 투표한 결과 한 개의 특정 후보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였지요. 다수가 좋아하는 후보안을 대표이사님은 ‘별로’ 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대표이사님에게 담당이사가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펼쳤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 네임은 제품특성을 설명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발음하기도 용이하고 독특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많은 관련 직원들 앞에서 담당이사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해서 떨떠름하게 대표이사님이 결론을 냈던 모양입니다. “그래? 나는 별~로지만 …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
그 제품은 성공하였을까요?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지인의 말에 의하면 해당 브랜드는 1년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끝내 시장에서 철수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품의 콘셉트도 좋았고, 네임도 좋았고, 가격도 적절하였고, 소비자 반응도 좋았는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반전’ 그 자체였습니다.
담당이사가 프로모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장님에게 결재를 요청하여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품 성공을 위해서는 광고, 홍보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한 푼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끝내 인지도 확보에 실패한 그 브랜드는 시장안착에 실패했습니다. …
어떤 회사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야기하다가는 큰일 날 이 사례는 사실 다수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 – – – – – – – – – – – – – – – – –
위의 에피소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집니다.
하나는 ‘관여’의 문제입니다. 내가 좋아서 결정하지 않으면 ‘애정’이 없게 된다는 것이 ‘관여’입니다. 간혹 어떻게 저런 네임이 브랜드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을까 궁금해지는 이면에서 ‘관여’가 있습니다.
이는 뒤집어 해석하면 의사결정권자가 좋아해야만 ‘소비자’도 좋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인의 선호도와는 무관하다는 특징이 있지요. ‘고관여, 저관여’ 라고 하는 마케팅 용어를 네이밍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결정권자의 언어감각이 강하게 투영된 ‘고관여’ 네이밍 프로젝트는 ‘어색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음 및 의미 모두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량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한 결과 그 어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히트 브랜드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많지요.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고관여’된 네이밍일수록 그에 대한 ‘브랜딩’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길어야 4~5음절 짧으면 2음절에 불과한 ‘네임’은 유달리 의사 결정권자의 관여도가 높습니다. 이것이 기업마다 각기 다른 특이한 스타일의 브랜드 네임이 탄생하는 배경입니다. ‘관여’가 지배하는 ‘네이밍’의 세계이지요.
그런데 네이밍 과정에서 ‘관여’는 꽤나 많은 문제를 양산합니다. 스텝-바이-스텝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네이밍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네이밍에 ‘고관여’된 실무, 임원, 대표이사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사장님은 이런 네임을 좋아하실 거야’ 하고 실무진이 후보안 수정을 요구하는 순간 산으로 가는 프로젝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왜냐 하면 수정된 내용을 보고받은 이사님이 생각하기에 ‘사장님은 그런 방향을 좋아하지 않아’ 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수정이 일어납니다.
실제 대표이사 보고 시에는 엉뚱한 후보안이 나타나는 관계로 보고 하는 사람, 보고 받는 사람 모두 얼굴이 벌겋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관여’ 때문입니다. 최초의 후보안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보고하는 사람 역시 확신을 못 가지게 됩니다. 그 역시 ‘관여’된 후보안을 강하게 추천하고 싶었으나,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후보안을 추천해야 하는 관계로 P/T 그 자체가 어색합니다 ~~
지금까지 필자가 사용한 용어인 ‘관여’에는 ‘내가 좋아하니까, 그 분도 좋아 할 것이야’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후보안을 ‘대표이사’가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는 실무, 임원 분은 많지 않을 것이기에… 결국 네이밍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관여’가 높아질수록 의사 결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바다에서 인삼을 캐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
‘관여’를 소비자 관점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관여’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의 이유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이기에 Insight 가 없어’라고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직관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네이밍 과정에서 ‘관여’를 강화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여’라고 하는 용어를 ‘주관’으로 바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밍’은 유달리 ‘주관’이 강한 세계입니다.
두 번째 시사점인 ‘브랜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은 프로모션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완벽해도 ‘인지도’ 확보에 실패하면 그 제품,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브랜드의 세계는 철저히 부익부빈익빈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의 장졸들이 관우 하나를 당하지 못하는 세계이죠. 이것이 ‘브랜딩’의 세계입니다. ‘브랜딩’의 세계에서는 ‘인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도를 기반으로 그 위에 ‘선호도’가 얹혀야만 ‘Brand Power’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최근 문득 ‘관여’를 생각나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다가 옛날 들은 지인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횡설수설해 보았습니다. (본 칼럼은 2014년 5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관여(關與)’의 의미 –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